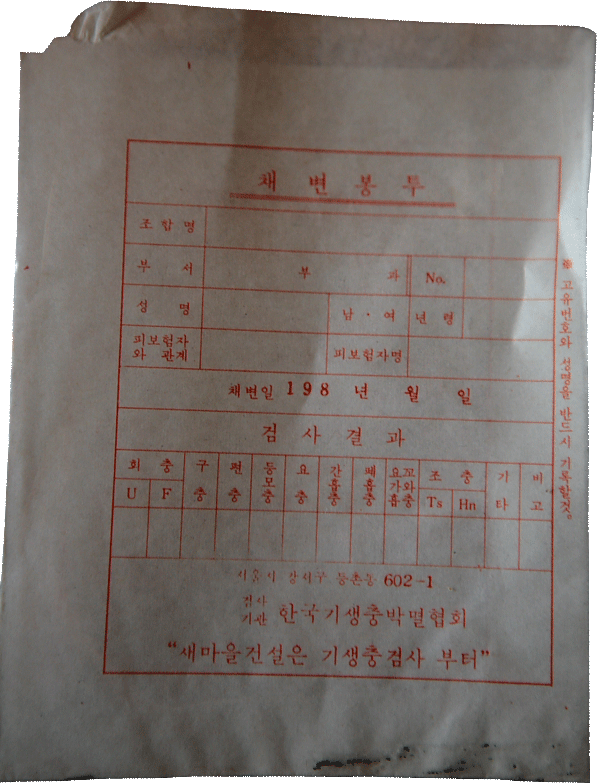허어, 참!
제목만 보고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부르르 진저리 치는 분들이 있네요.
하긴, ‘호환‧마마’만큼이나 끔찍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게 채변봉투이긴 하지요.
정 괴로운 분은 이쯤에서 읽기를 그만 두세요.
제게도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할 얘긴 하고 지나가야지요.
채변봉투를 빼고 우리네 지난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채변봉투는 말 그대로 변을 채집해서 넣는 봉투를 말합니다.
똥을 채집하다니….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이겠지요.
하지만 1970년대쯤 학교에 다닌 이들은 1년에 두 번 이 끔찍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위, 기생충 검사 및 회충약 집단투약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지요.
어느 날 종례시간에 선생님이 봉투 뭉치를 들고 와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웅성웅성, 정서불안 현상을 보입니다.
머릿속에 봉투를 채워가지고 오는 과정이 그려지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부잣집 아이에게도 가난한 집 아이에게도 하나씩 주어지는 봉투는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앞면에 ‘채변봉투’라고 쓰여 있고 이름, 학교명‧반‧번호, 성별, 나이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지요.
뒷면에는 이 봉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놓았습니다.
‘변은 반드시 본인의 것이어야 한다/바닥에 신문지를 펴놓고 다른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소독저로 세 군데 이상 밤알크기로 떠낸다/대변은 새로운 것일수록 효과가 확실…’
이런 웃지 못 할 내용들이었지요.
그 누렇거나 하얀 봉투 안에는 조그만 비닐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각자의 배설물을 채워 와야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그걸 제대로 못해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은 몇 번이나 요령을 설명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디, 소독저가 뭐래유?”
“암거로나 찍어와 임마. 집에 성냥개비는 있을 거 아녀.”
“작년에 성냥개비로 허다가 손 다 베렸는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풍경은 교실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내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녁에 일찌감치 끝내놓는 아이들도 있지만 ‘새로운 것일수록 효과가 확실’하다는 문구 때문에 보통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일단 뒷간에 신문지나 비료부대 같은 것을 깔아놓고 큰일을 봅니다.
이때 기대를 깨고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까운 배설물이 나오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배설물을 그 작은 비닐봉지에 넣는 과정도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봉투에는 분명 ‘세군데 이상 밤알 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데 밤알만큼 세 번을 떼 넣으면 봉투는 불로 지지기 어려울 만큼 빵빵해집니다.
어지간한 밤 세 개면 작은 고구마 하나만 한데,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 빵빵한 봉투를 들고 학교에 간단 말입니까.
물론 곧이곧대로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채변봉투에 담긴 사연이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게 웬 종이냐 싶어 할아버지가 담배를 말아 피운 집 손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누구는 제대로 담아서 마루에 뒀더니 개가 덥석 집어먹고 말았다나요.
채변과정이 귀찮아 몰래 된장을 넣어가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개똥을 채워간 녀석도 있다지요.
‘비닐봉지를 불로 지지라’는 지시를 착실히 지키려다가 봉지고 똥이고 다 태워먹은 녀석도 있고요.
채변봉투를 제출하는 풍경도 그리 아름다울 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민망한 표정으로 주섬주섬 봉투를 꺼냅니다.
하지만 늘 몇 명은 머리만 긁적이게 마련입니다.
잊고 안 가져온 녀석들이지요.
힘 좀 쓰거나 머리가 돌아간다는 녀석들이야,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친구의 것을 나눠달라고 조르거나 눈깔사탕 두어 개로 꾀기도 하지만 그도 저도 안 되면 ‘죽여주십사’ 할 수밖에.
그런 녀석들은 학교 변소로 쫓겨 가서 ‘현장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봉투를 내는 내내 퀴퀴한 냄새가 교실에 진동했습니다.
제대로 묶거나 지져오지 않은 녀석들 덕분입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도 그리 유쾌할 리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1번부터 이름을 부르며 감염된 기생충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기생충을 뱃속에 키우던 시절이니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불리기 마련입니다.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뱃속에 보관하고 있는 기생충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이들의 고개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무사히 마쳐도 또 한 번의 고통스런 절차는 남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구충제를 나눠줍니다.
그 약을 먹은 다음날은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헤집으며 회충의 숫자를 일일이 헤아려야하는 고통 역시 보통 일은 아니지요.
김개똥 3마리 박말똥 5마리…
수십 마리를 쏟아낸 누구는 부끄러워서 반쯤으로 줄여서 보고를 하기도 했다지요.
그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95%는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인분(人糞)을 거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마다 기생충 알이 득시글거렸고, 그걸 먹으니 뱃속이 기생충 보육실 구실을 하게 된 것이지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이었던 셈입니다.
오죽했으면 1964년에 ‘한국기생충박멸협회(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되고 1966년에는 기생충예방법이 공포됐겠습니까.
한 해에 두 번씩 채변봉투를 거두는 일은 1968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화학비료의 보급과 화장실 개량으로 인분사용이 줄어든 데다,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생충 감염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꾸준한 구충작업이 일등공신이었을 테고요.
그 결과 1997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기생충 퇴치 성공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그 때쯤은 채변봉투가 사라진 뒤였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채변봉투 시절을 이야기하면 ‘나무꾼과 선녀’ 같은 옛날얘기로 듣겠지요.
하지만 몇 십 년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고층빌딩들이 그냥 생길 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