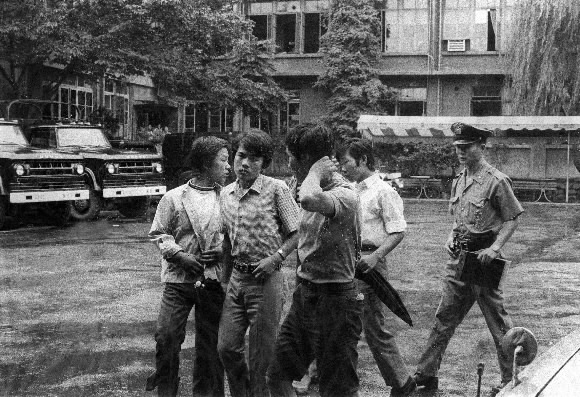왜~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1970년대는 긴급조치나 계엄령 외에도 장발단속‧불심검문 등 으스스한 단어들이 춤을 추던 시절이었다. 유신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던 시대. 반공이나 경제개발‧ 민족중흥 등의 거대명제(?)에 밀려 인권 따위는 장롱 속에 숨어 있어야 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골목길로 스며들기 일쑤였다. 길목 곳곳에 경찰이 포진하고 있었다. 저 멀리 경찰관이 보이면 후닥닥 뛰거나 슬그머니 다른 길로 빠져야 했다. 경찰관들은 가위를 들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훑었다. 그러다가 머리가 조금 덥수룩해 보인다 싶으면 불러 세웠다. 길목을 지키다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는 요즘의 음주단속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어이! 하고 지목당하는 순간 영화 <고래사냥>처럼 냅다 뛰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춤주춤 경찰관 앞으로 가기 마련이었다. 그 당시 경찰관에 대한 공포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도가 셌다. 뒷머리가 옷깃에 닿거나 옆머리가 귀에 닿으면 단속 대상이었다. 그걸 피하려고 머리를 파마로 말아 올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고개를 뒤로 조금 젖히면 짧은 머리도 옷깃에 닿는 판이니 처분은 들쭉날쭉 하기 마련이었다.
대가 조금 센 친구들은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게 뭐 길다고 그래요. 엊그제 깎은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읍소형도 많았다. “한번만 봐주세요. 바로 이발소 가서 깎을 게요” 하지만 대부분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기 마련이었다. 경찰관들은 가위나 바리캉으로 현장처분을 내렸다. 가위가 가는 대로 썩둑썩둑 잘라 ‘땜통’을 만들거나 바리캉으로 ‘고속도로’를 냈다. 파출소까지 끌려가서 ‘정신교육’을 받은 뒤에야 놓여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친구들은 머리에 난 고속도로를 그대로 둔 채 학교에 가기도 했다. 최소한의 저항인 셈이었다. 1970년대는 통기타와 청바지‧장발로 상징되던 청년문화가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유럽과 미국을 들끓게 했던 히피‧펑크족들의 반전‧염세문화가 유입되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반항 심리가 뒤섞여 새로운 기류가 형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청년들의 ‘작용’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작용’은 생각보다 거셌다. 신-구세대와 동-서문화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반사회적이며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대중가요를 금지곡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장발 등을 단속했다. 청년문화는 그렇게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청년문화의 억압은 장발단속에 그치지 않았다. 지금으로 보면 생각도 할 수 없는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미니스커트 단속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가위나 바리캉 뿐 아니라 30cm 자도 가지고 다녔다. 1970년대 젊은 여성들을 달뜨게 만들었던 미니스커트 바람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기성세대나 정부는 달리 별로 할 일이 없었는지 여자들의 짧은 치마를 못 견뎌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규제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유신정권은 1973년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거창한 이유였다. 경찰관들은 ‘과다노출녀'들에게 자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무릎부터 재서 맨살이 20cm가 넘으면 안 되었다. 치마길이의 마지노선을 법으로 정한 셈이었다. 적발되면 기초질서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곳곳에서 자를 든 경찰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숨바꼭질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서 치마까지 길이를 재는 경찰이나 적발을 모면해보겠다고 치마를 자꾸 내리는 아가씨들.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묘한 풍경이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추행이란 이름으로 제복을 벗어야 할 것이다.
가장 끔찍했던 건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이었다. 민중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젊은이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반독재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채찍으로도 최루탄으로도 잠재울 수 없었다. 거리에서는 수시로 불심검문이 벌어졌다. 긴급조치와 계엄령의 깃발이 펄럭이던 시절이었다. 젊은이들 서넛만 함께 지나가도 불심검문을 피하기 어려웠다. 서슬 퍼렇던 불심검문에 비하면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은 애교에 불과했다. 경찰들은 아무 곳에서나 젊은이들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가방 속의 내용물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예사였다.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그 정도가 되면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굴욕이었다. 가방검사를 거부하면 폭력이 뒤따르기도 했다. 시위를 할 때 아무리 강해도, 동료집단에서 벗어나 ‘개인’이 된 젊은이들은 공권력 앞에 힘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래서 설익은 저항은 대부분 패배로 끝났다. 가방 속에서 ‘반정부 전단’이라도 나오면 상황은 굴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불심검문의 ‘전리품’이 되어 끌려가야 했다. 그 상황을 벗어난 젊은이들도 시대의 아픔을 안주 대신 질근질근 씹으며 텁텁한 막걸리 몇 잔으로 울분을 억눌러야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 된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 탓인지 모르지만 격세지감이란 말을 실감케 한다. 대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꾸민다. 꽁지머리를 했다고 새파랗게 염색을 했다고 빡빡 밀어버렸다고 나라에서 간섭하는 일은 없다. 젊은 여자들의 치마도 마찬가지다. 한때 ‘똥꼬치마’라는 게 유행할 정도로 치마길이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치마가 짧다고 자를 들고 쫓아다니는 경찰관이 있다면 아마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시위문화도 마찬가지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라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검은 교복‧검은 모자‧빡빡머리가 ‘학생’의 상징이던 시절. 교련복‧예비군복‧민방위복이 공동의 선(善)을 의미했던 시절. 펄럭이는 국기만 봐도 거수경례가 절로 나오고 국기하강식 음악이 흘러나오면 나오던 똥도 기어들어가던 시절. 그런 시절은 이미 전설처럼 아득한 과거가 됐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 전 일도 아니다. 지금도 저 앞에 경찰관이 보이면 슬그머니 머리에 손이 올라가는 중년사내들이 있는 걸 보면 악몽은 죽음으로서야 망각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