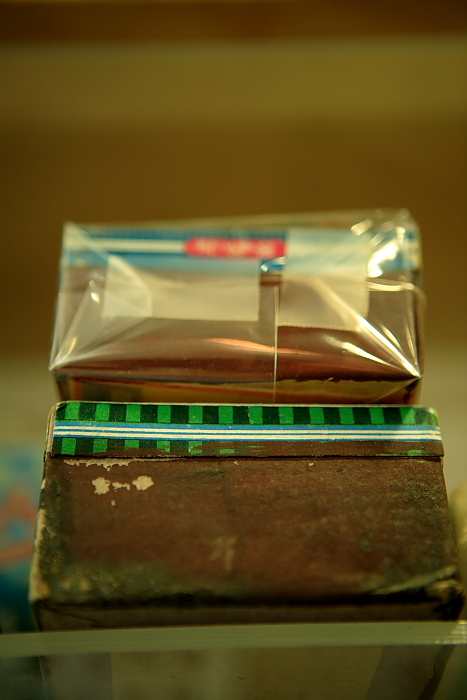"저게 뭔 일이라냐?" 방금 뽑아온 콩대를 마당에 널던 할머니가, 입 벌린 까치독사라도 본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마루에 엎드려서 숙제를 하던 아이가 덩달아 놀라 벌떡 일어난다. 주변을 두릿거려 보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마당가에서 한가롭게 익어 가는 감과 대추 뿐, 특별한 게 없다.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우물가에서 허드레 양동이를 주워든 할머니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음질친다. 할머니를 뒤를 따라서 시선을 옮기던 아이가 억! 하고 비명을 삼킨다. 마을 건너 밤산 어귀 외딴집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오르고 있다.
논둑에 불을 지르거나 덤불을 태울 때의 연기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렇다면 불이 난 게 틀림없다. 밤산 외딴집이라면 용구네 집이 아닌가. 아이는 후닥닥 마루를 내려와 꿰지 못한 신발을 두 손에 든 채 할머니를 따라서 내달린다. 할머니와 아이뿐이 아니다. 양동이든 바가지든 그릇 하나씩을 손에 든 동네사람들이 용구네집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초가을 오후의 황금 같은 햇살이 뒤를 따라 달음질친다.
아이가 용구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이 집을 꿀꺽 삼켜버린 뒤였다.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온 사람들이 샘에서 물을 퍼다 끼얹어보지만 불길은 혀를 날름거리며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집이라 사람들이 늦게 온 탓도 있지만, 나무로 엉성하게 지은 오두막은 불길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다. 화마가 집 한 채를 통째로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그 순간, 한 여자가 구를 듯 달려와 불타는 집으로 달려들어간다. 발빠른 동네 사람 하나가 쫓아가 간신히 잡는다. 용구 엄마다. 남의 집 밭일이라도 나갔다가 연기를 보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비명은 소름이라도 돋을 듯 날카롭다. "아악! 용구 좀 꺼내줘요. 내 새끼 용구가 저 안에 있단 말여!"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그제야 집안에 거동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이 난 동네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녀 보지만 누구도 악마처럼 타오르고 있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못한다.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불길로 들어가려다 여러 번 좌절당한 여자는 결국 거품을 물고 혼절하고 만다. 사람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눈가를 훔친다.
용구는 소위 앉은뱅이라고 불리는 하반신을 못쓰는 아이다. 태어날 땐 멀쩡했는데, 세 살 나던 해 크게 앓은 뒤 그리 되었다. 하나뿐인 아들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돈을 벌러 집을 떠난 용구아버지는 몇 해 째 소식이 없었다. 용구엄마가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해서 얻은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언젠가 혼자 있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기어 나왔다가 토방에 떨어져 죽을 뻔한 사건이 생긴
뒤로, 용구엄마는 일을 나갈 때마다 방문 밖에서 빗장을 걸고 간다. 그게 탈이었던 모양이다. 심심했던 아이가, 등잔 옆에 놓아둔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불꽃이 옮겨 붙었을 것이다. 방안에서만 살던 아이, 용구는 그렇게 친구 하나 사귀어보지 못하고 떠났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탄생한 도구가 되레 어린 생명 하나를 빼앗아간 셈이었다. 그 시절 그런 비극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한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성냥은 최고의 보물이었다. 조금 큰 아이들은 호주머니에 몰래 성냥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어른들이 성화를 부려도 소용이 없었다. 늦봄이면 보리서리, 밀서리에 필수품이었고, 겨울이면 모닥불을 놓거나 쥐불놀이를 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다가 불을 내기 일쑤였다. 논둑에 놓은 불이 산불이 되기도 했고, 불장난을 하다가 집 한 채를 홀딱 태우기도 했다.
성냥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생활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만큼 편리한 도구였다. 부싯돌이 아주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했다고 하지만, 편리성으로야 어찌 성냥의 발치나 따라갈 수 있었으랴. 특히 불씨를 누대로 보존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이 땅의 여인네들에게 성냥의 등장은 말 그대로 복음이었을 것이다. 성냥의 발명은 인류에게 진정한 의미의 불을 가져다 준 셈이었다. 그 전까지는 불이 필요하면 나뭇가지를 팔 아프게 비벼대거나 부싯돌을 여러 번 두드려야 했을
테니까.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에는 불씨를 꺼뜨리는 며느리를 내쫓기까지 했을까? 최초의 성냥은 1827년 영국의 J.워커가 염소산칼륨과 황화안티몬을 발화연소제로 써서 만든 마찰성냥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880년 개화승(開化僧) 이동인이란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수신사 김홍집과 동행해서 귀국할 때 처음으로 성냥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바로 성냥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건 아닌 듯 하다. 한일합방 후 일제가 인천에 '조선인촌(朝鮮燐寸)'이라는 성냥공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일반에 보급되었다고 한다.
일제는 인천 외에도 수원·군산·부산 등에 잇따라 성냥공장을 세웠는데, 조선사람들에게는 만드는 방법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장을 독점하고, 조선인들에게는 쌀 한 되를 가져가야 성냥 한 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착취였던 셈이다. 아무리 비싸도 이미 그 편리함의 단맛을 알아버린 이상, 성냥은 어느 집을 막론하고 필수품이었다. 전기가 집집마다 들어오기 전인 1970년대까지도 등잔불을 켜거나 밥을 짓기 위해 성냥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담배 역시 성냥이 없으면 피우기 힘들었다. 그래서 양식이나 땔감 못지 않게 귀한 대접을 받은 게 성냥이었다. 성냥공장들은 한 때 최고의 호황산업으로 각광받았다. 만들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니 그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지역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게 성냥공장이었다. 유엔·아리랑·향로·기린표·새표·복표·야자수·대한·비사표·제비표·두꺼비표·토끼표…. 미처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성냥의 종류도 많았다. 어느 집이든 부뚜막 위나 등잔 아래, 재떨이 근처에는 성냥이 떡 하니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선반 위에도 몇 통의 성냥은 비축해둬야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피붙이처럼 가까웠던 것도 내칠 만큼 비정한 것이다. 성냥은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구경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 되어 버렸다. 굳이 위상이 결정적으로 추락하게 된 시기를 따지자면 1980년대 후반부터였을 것이다. 어느 골짜기라도 전기가 들어가고, 집집마다 전기밥
솥에 가스레인지에 전자레인지까지 성냥이 없어도 가동될 수 있는 도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찬밥신세가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순간 편리하고 값싼 1회용 라이터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부터는 담뱃불을 붙일 때 쓰는 일조차 뜸해졌다. 그나마 한 때는 판촉용 상품으로 명맥을 유지했었는데, 중국산 성냥이 들어오면서부터 실낱같던 숨통마저 끊어놓았다. 마당엔 아름드리 미루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침저녁으로 수백 명의 여공들이 드나들던 성냥공장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다. 그렇게 '위험한 물건' 성냥이 사라져갔으니 성냥 때문에 희생된 용구 같은 아이는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뜨고 있다. 어쩌면 성냥과 함께 살던 시절이 그나마 안전했던 건 아닌지…. 성냥이 다시 서민들의 부엌이나 호주머니로 돌아올 날이야 있을 수 없겠지만, 성냥과 함께 했던 시절의 기억은 먼 훗날까지 아련하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