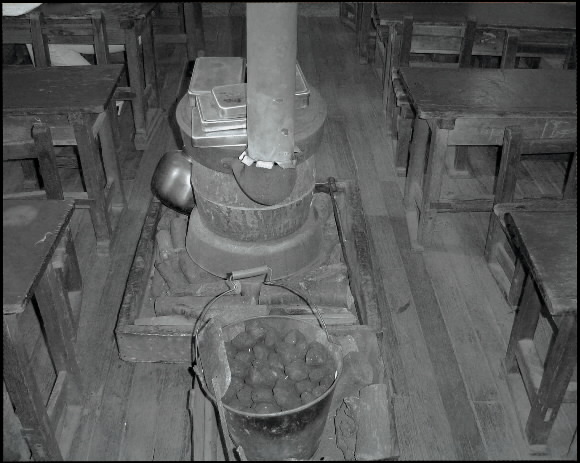
어지간한 추위 정도는 그러려니 하는 어른이 돼서도 등굣길 위를 달음박질치던 그 작은 아이를 생각하면 괜스레 몸이 옹송그려지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농촌이었지만 바다도 그리 멀지 않아, 가끔 마실가듯 갯벌에 나가 게나 조개를 주워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국민(초등)학교까지는 한 시오리길 되었지요.

요즘 아이들에겐 제법 먼 길이겠지만, 그땐 시오리라면 쉽사리 다녀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보다 두 배쯤은 먼 곳에 사는 아이들도, 농사일을 돕느라 혹은 노는데 팔려서 학교에 빠진 적은 있어도 길이 멀다고 결석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씩씩한 아이들에게도 겨울은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야 눈구덩이에 묻어놔도 한숨 자고 나올 만큼 따뜻하게 입히지만 그 시절은 어디 그랬나요.
좀 산다는 집 아이들이나 솜 넣은 누비옷에 무릎 나온 내복이라도 챙겨 입었지, 샅이나 겨우 가리고 겨울을 나는 아이들도 없지 않았으니까요.
등굣길은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었지요.
바닷바람 무서운 거 아는 분은 날마다 아이들에게 닥치는 추위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갈 겁니다.
차디찬 바닷물에 밤새 몸을 얼렸던 바람이, 신작로 가에 웅크리고 있다가 후다닥 달려들어 뺨을 할퀴고 도망치고는 했습니다.
아! 피가 얼어붙는 것 같던 그 추위….
그렇게 늘 찬바람, 찬 물에 노출 된 아이들의 손은 툭툭 터서 피가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 터진 손을 덮치는 바닷바람은 저주처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교실이라고 해봐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예사였으니 한데보다 그다지 나을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난로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을 내뿜는 시대라야 그것도 만만하지요.
난로를 피우려면 먼저 당번이 창고에 가서 조개탄을 타 와야 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대신해 주기도 했지만, 일꾼 하나 몫을 하는 고학년
곱은 손으로 바께쓰라 부르던 함석양동이를 들고 창고 앞으로 가면 하루 분량의 장작과 조개탄을 나눠 줍니다.
조개탄이란 무연탄에 목탄분말(숯가루)과 펄프폐액(廢液)을 혼합해서 조개처럼 뭉친 고체연료를 말합니다.
난로를 피울 땐 종이를 불쏘시개 삼아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장작이 타오르면 그 위에 조심스럽게 조개탄을 올립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장작불마저 꺼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참 뒤 조개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교실을 점령했던 냉기는 조금씩 물러가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지요.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 문을 열고 들어설 무렵이면 교실은 제법 훈훈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난로 곁으로 달려듭니다.
꽁꽁 얼었던 손에 갑자기 열기가 닿으면 깨질 듯 아프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추위보다는 덜 무섭거든요.
젖은 옷이나 양말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것 역시 난로였습니다.
얌체들은 젖은 양말을 연통의 철사에 걸기도 했습니다.
양말을 매일 갈아 신던 시절이 아닌지라(그럴 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향기로울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선생님께 꿀밤 한 대 맞고 걷을 수밖에요.
난로가 달아오르면 위에 올려놓은 커다란 주전자에서도 물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수증기의 몸짓에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장단을 맞추면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가슴까지 훈훈해집니다.
언뜻 내다본 창밖으로 눈이라도 펑펑 내리는 날이면, 온몸이 가라앉을 듯 노곤
세월이 온갖 것을 덧칠한 지금 생각해봐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난로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찰떡궁합’이 하나 있지요.
바로 ‘벤또’라 부르던 도시락입니다.
4교시가 끝나는 종이 울리면, 선생님이 나가시기도 전에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 들고 부리나케 난로가로 달려갑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뭐, 가장 좋은 자리는 늘 한 주먹 하는 ‘일그러진 영웅’들이 차지하기 마련이지만요.
그때쯤이면 난로가 약간 식은 뒤기 때문에 도시락을 그대로 올려놓아도 밥이 금세 타지는 않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찌그러진 도시락들이 제법 열을 받아들일 무렵에는 냄새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반찬 째 올려놓은 도시락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맨 아래 도시락의 밥이 눌어붙는 구수한 냄새….
밥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순간은, 기대가 주는 행복과 기다림이 주는 고통이 반반씩 교차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훗날의 어떤 진수성찬도 그 때의 그 ‘가난한 밥’을 따라갈 수 없더란 것이지요.
그리고는 군에 입대해서 정점을 찍게 되지요.
요즘은 군에서도 보일러 난방을 한다지만 그 시절에는 ‘뻬찌까(페치카)’라고 부르던 벽난로나 경유난로를 주로 썼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소위 벌통난로라고 부르던, 겉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경유난로를 사용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기름통을 들고 보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날들은 추억보다는 고통에 가깝게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기름을 제 때 못 타거나, 밤에 난로를 꺼트려서 하늘같은 고참병들을 떨게 만
요즘에도 난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가스난로는 난방용구로서 여전히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어린 시절의 정감을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새벽시장의 드럼통 난로나 오래된 이발소를 지키고 있는 무쇠난로 쯤은 돼야 마음이 훈훈해 지지요.
그들 앞에 서면 운동장을 가로질러 씩씩하게 달려가는 추억 속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낀 하얀 성에가 온갖 그림을 그리던 아침, 곱은 손 호호 불며 난로를 피우던 아이.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에 몰래 가져온 가래떡이나 고구마를 올려놓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
젖은 단벌 나일론양말을 말리다가 호르르 태워먹고 울먹이던 아이.
그 아이들이 저만치서 환하게 손짓합니다.









